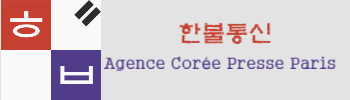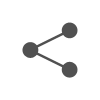EU 연합에서 분열로
EU 연합에서 분열로
이라크전 때 동서로 갈라진 이후 유럽위기
20년 전 쟈크 시락 길의 양상과 비슷
‘안보 중시’ 폴란드 등 동유럽 우크라전 계기로 ‘서방편’ 뚜렷
서유럽은 중·러 경협 의식하며 美에 ‘거리두기’

한불통신-ACPP)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국제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EU 국가간 입장차가 갈수록 선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 대륙 중부·동부를 아우르는 이른바 ‘신유럽’은 미국 중심의 안보 전략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서유럽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구유럽’은 중국·러시아를 통한 경제적 이익도 함께 추구하며 대조가 뚜렷 해지는 모습이다.
이는 20년 이락크 대량살상무기 보유에 따른 미국의 선전포고에 반대했던 자크 시락 대통령의 모습과 마크롱의 모습과 겹쳐진다.
그 때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지만 EU연합에서 분열로 가고 있는 것은 세계사적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7일(현지시간) 칼럼을 통해 “20년 전 도널드 럼즈펠드가 만든 ‘구유럽 대 신유럽’이라는 패러다임이 유럽 동부 전쟁으로 되살아났다”며 분석했다.
WP가 지적한 유럽 신구 세력간 대립구도는 2001년 9·11 테러를 당했던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초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이듬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부상한 개념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이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하겠다며 군사행동에 나선 미국에 반대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비축 확인을 우선적으로 유엔 차원의 사찰을 고수하던 때다.
당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독일과 프랑스 등을 가리켜 “오래된 유럽일 뿐” 이라며 “전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서 유럽을 보면 무게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국에 상대적으로 더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던 중·동부의 ‘신유럽’ 국가들을 추켜세우며 군사작전에 대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WP는 이런 이분법적 구도가 20년이 지난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시금 되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및 ‘친러’ 벨라루스와 접경한 유럽 동부의 폴란드,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 ‘발트3국’ 등이 ‘신유럽’의 대표 주자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놓는 어떤 외교적 제안에도 의심 어린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최근 중국을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친중’ 행보를 직격하며 신구 세력간 구분선이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

그는 지난 11일 미 워싱턴 방문 직전 인터뷰에서 “미국으로부터 전략적 자율성을 구축하는 대신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유럽의 ‘전략성 자율성’을 강조했던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정면 반박했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당일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과 만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서는 “옛 유럽은 러시아와의 합의를 믿었고, 실패했다”.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고 있는 새로운 유럽이 여기에 있다” 고 안보의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유럽’ 내 일각에서도 이런 현상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작년 8월 체코를 방문한 자리에서 “유럽의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영국 옥스포드대 티모시 애쉬 역사학과 교수는 “숄츠의 말이 맞다”.
“유럽연합(EU) 여러 이사회에서도 중부·동부 유럽의 의견이 점점 더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유럽 확장에 대한 의제가 테이블에 오르고 있다” 고 설명했다.
실제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며 군비 지출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중국산 제품 수입과 러시아산 에너지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에만 골몰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동유럽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대만해협에서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을 놓고도 온도차가 감지된다.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대만에서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만 한다”.
“우크라이나가 정복되면, 다음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마크롱 대통령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을 가리켜 중국편을 들었다.
또 서유럽은 분명 중·러 경제협력을 의식하며 美에 ‘거리두기’에 나섰다고 이번 프랑스 중국 공동성명에서도 볼 수 있다.
마크롱은 “우리 유럽인이 이 사안에서 졸개가 돼 미국의 장단 맞추기 보단 국가별 자율에 따라야 한다.
또 중국의 과잉행동에 반드시 적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여러 상황 중에 최악일 것” 이라고 발언해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서유럽 국가들 역시 중국·러시아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내심 미국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싱크탱크 유럽외교협의회(ECFR)의 제레미 샤피로 및 자나 푸글리에린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지정학적 경쟁의 시대에서 미국의 속국화(vassalization)는 현명한 정책이 아니다”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에 주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를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초강대국들의 노리개가 되는 결과를 낳을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불통신,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dk@yna.co.kr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EU